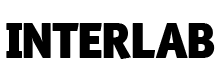이중성을 공유하며
김주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활기를 띠어 감에 따라 2019년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자역학의 대표 특성인 파동과 입자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파동-입자의 이중성’을 처음으로 증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이것은 생체 분자를 이용해 발견되면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되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이중성’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가시선 너머(Beyond Line of Sight)》 전시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이라 느끼는 이 공간은 거시적 체계로서 이해되는 세상이다. 그런데 고전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법칙만으로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요소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양자역학이 초미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된다. 바로 우리가 ‘보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물론 물리학자들이 이 법칙을 실험하고 밝혀내는 것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동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환유의 방식을 대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가시선 너머》 전시가 ‘스마트 폴리 구축을 위한 건축, 예술, 공학 융복합 연구’의 일환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것에도 공명한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현상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그것은 ‘폴리’라는 형태이자 제3의 또 다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태도이다. 방식과 요소는 다르지만, 이 연구 프로젝트와 전시가 다루고 있는 핵심을 관통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순간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가 글의 초입에서 양자역학을 거론한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의 사유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발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로 세상을 파악하며 그 언어의 중심에는 이분법적 개념으로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미술 담론이나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이분법을 철회하자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진부한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경계의 해체를 표현한 단어의 본래 목표는 결국 우리가 감각하는 것 이상의 또는 인지하는 것 이면의 어떠한 가능성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초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파동과 입자의 상이한 특징이 사실상 동시에 그 성질이 공존한다고 말하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은 이러한 이분화된 개념의 이해로 진행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 전시에서는 ‘시각화된 경계의 해체’와 ‘혼종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경계의 해체와 거기서 보여지는 혼종성을 물질적 허상과 비물질의 재현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물질은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상이 분명한 특징을 보이고 본래 비물질은 재매개되지 않으면 가시성을 띠지 않는다. 하지만 비물질이 재현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실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가시선 너머》 전시는 실로 양분화 된 것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지점을 묘사한다. 상업화랑이라는 전시 공간이 을지로와 용산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관람객은 그 사이를 관통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이 두 공간은 여러 상충된 것들을 통합한다. 마치 거시세계의 법칙 속에서 미시세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듯이 우리는 위상학적으로 이 두 전시를 오고 가며 모든 이분법에 대항한다.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이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서이다. 어찌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에는 특별한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때도 있다. 그렇듯 이번 《가시선 너머》 전시의 작품도 표면적인 것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그 이면의 질서를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를 보는 방식을 뒤집어 이중적인 것이 공존하고 새로운 세계를 읽어내는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험은 현실의 법칙에서 반드시 명료하게 정의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실제의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 이번 전시에서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자각하고자 하는 작가는 한지형(s.a.h), 박정선, 한윤제 작가가 있다. 한지형(s.a.h) 작가의 경우는 이를 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환경이 실제 현실 공간에 왔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현실과 가상의 불일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박정선 작가는 이러한 미시세계의 법칙을 현실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듯, 우리가 식별하기에 비슷해 보이는 개체가 사실은 미세한 차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경계를 밝히고자 한다. 한윤제 작가도 우리가 현실의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대상을 쪼개어 개별적 대상으로 분리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한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비물질과 보이는 것-물질이 공존하고 있다. 작업을 통해 비물질적 요소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는 이서진, 김휘아, 정성진이 있다. 이서진 작가는 하나의 돌산이라는 환경을 형성한 후 기도라는 정신적 행위를 통해 돌탑을 쌓는 수행적 행위를 완성한다. 이것은 비물질성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또한 김휘아 작가는 VR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경계를 실험한다. 관람자는 VR을 체험하는 가운데 현실 공간에 있는 체인을 터치하게 되면서 가상의 공간에 몰입하고 있는 관객이 현실과 가상의 오고감 속에서 경계를 마주하게 된다. 김휘아 작가가 현실에 영향받는 가상의 공간을 구현했다면, 정성진 작가는 비물질적 매체가 만들어내는 형태를 물성을 가진 구조로 만들어내어 현실과 가상의 이질성을 동시에 결합한다. 이를 통해 그는 이중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성을 실험하는 작가로 이대철, 김채린, 안예인이 있다. 이대철 작가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성을 넘어 그 의미가 고정되려는 순간 다시 미끄러지고 이탈하게 되는 의미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불확정성과 불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미를 확신할 수 없는 다양성의 세상을 은유한다. 김채린 작가도 이러한 불확정성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데, 작가의 작업 부산물인 오브제는 조립형 모듈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작업의 일부가 되고 계속 순환하며 가능성으로 무장된 세계를 항해한다. 또한 가능성의 순환을 보여주는 안예인 작가는 ‘계단’이라는 단순한 패턴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계속 반복되고 새로운 공간으로 인도한다.

이처럼 《가시선 너머》 전시에서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디지털과 아날로그, 가상과 현실에 대한 이질적 결합을 이중성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시각예술의 범위에서 물질적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장준호 작가는 합판과 네온의 조화를 통해 개기월식을 상징하는 유사자연을 만들어낸다. 이 유사자연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는데, 작업의 소재로 사용된 나무 합판은 자연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위적으로 가공된 사물이기도 하다. 또한 네온은 생명이 없는 듯 보이지만 진공관 속의 움직임을 통해 살아있는 듯한 빛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중성의 공존을 강정윤 작가의 경우 내부와 외부가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강정윤 작가는 도시 주거지의 반복된 구조 속에서 일상의 삶과 태도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내부와 외부가 서로 순환화는 시놉티콘의 감시의 시선에 빗대어 해석한다. 박형조 작가는 이러한 현대의 삶을 이미지와 물질의 순환 구조에서 사유했다. 이미지의 생산, 유통, 물질의 재조합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촉감을 유발한 이미지를 물질로 변환한 후 관객이 전시장에서 조각을 탑의 형태로 완성하게 만든다. 이충현 작가 역시 탑을 소재로 작업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오래된 석탑이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것을 떠올려 이 시멘트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새로운 조각을 만들어낸다. 한 유적의 보수를 위한 지지대가 아닌 독립적 개체로서 하나의 물질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세계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상 공존하는 체계 속에서 이해 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이중성의 공존과 새로운 개념을 향한 탈주의 방식은 이 전시에서 장소와 공간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폴리로서의 건축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계획은 이채은, 최다빈, 양시현 세 명으로 구성된 건축전공팀에 의해 구현되는데, 본래 장소의 문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건축의 한계를 벗어나 장소에 따라 변모하는 해체와 조립의 건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탈주와 해체는 사실상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이다. 예를 들어 고경호 작가의 경우 백령도 두무진 땅속에 숨어있는 벙커를 지상에 드러내려 한다. 이때 그는 이곳을 투명한 공간으로 전환하여 그린포인트로 만들고자 한다. 새로운 ‘green point’로서의 GP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때 GP는 휴전선 감시 초소를 뜻하는 ‘Guard Post’의 이중적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새로운 가능성의 탐구는 기존의 언어에 대한 사유, 공간에 대한 사유, 물질에 대한 사유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질성을 통한 이분법적 개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공존과 융합의 사유를 시도하려는 실험으로써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파동-입자의 이중성’과 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질적인 것들끼리의 결합은 우리의 현실을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이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실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