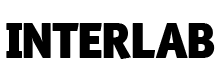정물로 나아가다 만 형상 : 임민정 <New-Still Life>
새로움에 대해 우리가 거는 기대와 실천 태도는, 사실 어쩌면 두 얼굴로 과거와 미래의 정반대 방향을 동시에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술사에서 ‘신’ 혹은 ‘뉴(New)’가 붙은 사조를 보면, 이전 것과 비슷하나 새로운 특징을 찾았을 경우 이 같은 수식어를 종종 붙인다. 다만 여기서 새로운 사조를 가리킬 때, 무에서 태어난 신적인 창조물보다 원류에서 하류로 방향성을 지니고 흘러가듯이, 원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발전되든 혹은 아류로 불리든지 간에, 그 출발점과 간격이 멀리 벌어지면 원래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새로움이다. 단절과 무에서 태어나는 창조과 달리 원천으로부터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질감이 개입된다. 원류와 파생된 사태는 연장선 상으로 묶을 수는 있어도, 두 개를 똑같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움이라는 말은 모순적인 성격을 동반한다. 회고와 발전, 즉 한쪽에서는 미래를 향해, 다른 한쪽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는 두 얼굴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이란, 새로운 요소와 과거의 양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끌어안은 결합체, 즉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연속선으로 볼 수 있다.
가변크기에서 소개된 작가 임민정의 작업은 크게 회화의 오브제로 나눌 수 있다. 한쪽에 회화 작업이 보이고, 또 다른 한쪽에 오브제가 보이는데, 이 작품은 캔버스에 (재현적으로) 그려진 추상적 형상이 하나씩 떼어내듯 전시장 벽에 걸려 있다. 작가는 후자를 ‘분리된 평면 오브제’ 라 부르는데, 작품 제목 그대로 회화작업에서 그려진 형상들이 전시장 벽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작업 유형의 연관성은 굳이 제목을 알지 못해도 시각적으로 포착된다. 표현과 모티프는 두 작업에서 서로 같아 보이고, 개별 형상들이 정착된 매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 사실상 캔버스가 있고 없고 하는 차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형상자체에 차이를 따져볼 이유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의 유무를 고려하여 작품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캔버스가 없는 경우, 형상들은 캔버스의 테두리가 긋는 물리적 제한을 떠나 보다 넓은 전시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소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작가의 오브제 작업은 회화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때 단순히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다는 사실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회화의 성격이란 환영의 창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려진 형상의 납작함과 그것들이 벽에 붙어 있다는 사실에서, 작가의 오브제 작업이 회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의 납작함, 그러니까 포스터칼라를 써서 명암 없이 그린 것과 같은 표현자체에 회화의 성격이 나타난다. 평평한 하나의 스티커처럼 보이는 표현방법 자체에 이미 이차원적 표현성이 내재되어 있다. 캔버스 위에서 형상들은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공간감이 생기는 것과 같이, 등장하는 레이어들끼리 겹쳐 쌓인 얇은 공간(감)을 창출한다. 이는 펜으로 그린 드로잉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형상자체가 레이어를 끼어넣은 듯 존재하고, 형상 하나에 명암과 다른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캔버스 위에 나타난 형상 자체의 이러한 납작함이 결과적으로 캔버스를 떠나게 만든다. 개별 형상자체의 고립은 그것들을 스스로 캔버스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벽에 붙은 형상들은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요소들과 어울리는 가능성 또한 포함한다. 제한적인 캔버스 영역보다 좀 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작가는 형상들에게 또 다른 표현공간을 허락해준다. 그렇지만 이때 형상자체는 벽에 걸려 작품이 될 때, 회화에서 드러난 레이어를 상실하고 다시 평면으로 돌아온다. 이들은 서로 겹치지 않은 채 오브제로 따로따로 전시되는데, 오히려 캔버스에 표현되었을 때가 공간감의 깊이가 있었다. 오브제로서 제작되는 형상들은 좀 더 넓은 공간을 수용하지만 이번 작업에서 사실상 다시 평면으로, 즉 전시공간 벽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럼에도 캔버스의 우무에 따른 확실한 차이는 점과 선, 그리고 면이 캔버스의 그 특수한 공간에서 (테크닉적인) 재현으로 각각 인식되었다면, 벽에 달라붙는 형상은 얇은 두께를 통해 면 그자체가 된 성격을 인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은 더더욱 오브제보다 회화에 가깝다. 바닥이나 좌대에 놓이지 않고, 그러면서 공간감을 거의 전시공간이라는 보다 실질적인, 단순한 비유가 아닌 ‘하나의 평면’으로 환원시키면서 작품에서 오브제의 성격이 거부되고 있다.
이번 전시 타이틀이 <New-Still Life>인데, 여기서 새로움, 그러니까 ‘New’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물화의 일반적인 범주에서 작가는 정물 그 자체에 회화의 재현 요소를 근접시켰다. 술병이나 과일이 캔버스 위에서 포착된 시기를 시작으로 20세기에 새로운 매체를 통해, 예를 들어 샘 테일러 우드(Sam Tayler-Wood)의 영상에서 시간이 개입되고, 코세무라 마미(Kosemura Mami)와 로라 레틴스키 (Laura Letinsky)가 사진으로 대상―전자는 버려진 물건을, 후자는 일상적 삶의 흔적을―을 포착하였듯 정물화는 그때까지 여러 매체를 통해/에 따라 해석되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오브제 작업에서 작가가 보여주는 새로움이란, 정물‘화’라는 말이 그렇듯 회화에 근거하면서 형상들이 정물 그 자체로서 나타난다. 이때 표현의 대상인 형상과 표현매체의 괴리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캔버스 위의 그려진 대상이 아니라, 그려진 모양이 오브제 자체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형상들이 그 자체로 물질적인 오브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작가의 납작하게 그리는 표현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여러 색을 섞어 명암과 재현적 공간감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린 대상이 평면적인 오브제가 되는데, 이때 더 이상 재현된 형상이 아니라 오브제 자체가 된다. 따라서 제목이 <분리된 평면 ‘형상’>이 아닌 이유는, 그것들이 분리되어 ‘오브제’가 된 형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형상은 완벽한 오브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때, 관람자는 작품에서 새로움의 두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재현에서 형상자체가 되어 공간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여전히 캔버스 역할을 대신하는 지지체를 통해 벽에 붙어 있는 형상들이 거기에 있다―벽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향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캔버스를 그리워하면서.

editor Yuki Ko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