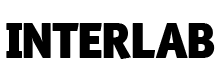아오시마 치호와 일본의 시선
인간과 로봇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자 셰리 터클(Sherry Turkle)은 저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로봇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을 분석한다. 마치 진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센서로 인식하고 방문자에게 시선을 보내지만, 사실 그것은 살아있지 않은 존재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당연시 하지만 사람들은 기계에 손을 흔들거나 말을 건다. 터클은 이처럼 인간과 인간의 인공물인 로봇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과학기술적인 발전을 거쳐 일본에서 발명된 로봇에 대해 언급한다. 더불어 터클은 일본에서 옛날부터 사물이나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온 전통을 설명한다.
일본에서는 사람 외에도 시선을 주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잘 안 되는 존재 즉 물건이나 죽은 사람이다. 에미니즘이나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 ‘신토’ 사상을 보면 살아있는 존재가 인간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려받은 유물을 고인처럼 여기거나 나무에 영혼 깃들어있으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건축물을 짓기도 한다. 예술작품과 관련시켜보면 동물이 사람처럼 노는 <조수희화>이나 괴담 형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령의 존재처럼 그들은 사람과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생활한다. 이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존재가 모호한 일본의 특징은 현재 활동하는 아오시마 치호(青島千穂)의 작업에도 나타난다. 아오시마 치호의 작업에서 흔히 등장하는 존재는 두 눈을 가진 빌딩이나 묘석 또는 유령들이다. 그녀가 2016년 여름에 도쿄에서 선보인 영상작업을 보면 원래 생명을 갖지 않은 존재들이 속삭이거나 춤을 춘다. 에니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영혼을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면, 아오시마의 작업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화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영상재생의 형태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화면에 나오는 생물이 아닌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 전시에서 <묘석짱이 멍하니 떠올리는 것>이라는 작업은 관객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세 화면으로 구성된 작품 앞에 관람객이 오면 센서를 감지하며 화면에 나오는 묘석이 노래를 하고 나무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것은 작품의 방식을 읽으면 상호작용적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관람객은 화면으로 다가감으로써 영상 속 대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거기서 관람객의 존재는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작품에 개입이 된다.
2016년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첫 회로 열린 《오카야마 예술교류》에서 작가 리암 길릭(Liam Gillick)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에서 일본 아니메를 연상시키는 눈 그림이 광고로 나와서 처음 보면 무슨 광고인지 모를 수도 있다. 눈을 광고 모티브로 삼은 여러 이유를 인터뷰에서 설명하면서 길릭은 그 중에 일본 특유의 시선이 갖는 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서구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느껴지는 시선의 존재는 길릭이나 앞서 언급한 터클보다 시기를 앞서서 나왔었다. 20세기가 되는 시기에 라프카디오 헌(Lafcadio Hearn, 고이즈미 야쿠모)은 일본으로 와서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여 글로 남겼다. 그가 수필형식으로 엮은 책인 『일본』이나 『마음』이나 구전 신화를 수집한 『괴담』을 읽어도 사람들이 자연물인 나무나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 더 나아가 신봉하는 대상으로 모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일본의 문화적 분위기는 존재한다.
<사진자료> Casa BRUTUS [Shttp://casabrutus.com/art/24584/2]
<참고자료>
셰리 터클 / 이은주 역, 『외로워지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2
ラフカディオ・ハーン / 平井呈一, 『心―日本の内面生活の暗示と影響』, 岩波文庫, 1977
ラフカディオ・ハーン / 池田雅之, 『日本の面影』, 角川ソフィア文庫, 2000
《오카야마 예술교류》 도록
editor Yuki Ko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