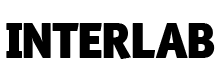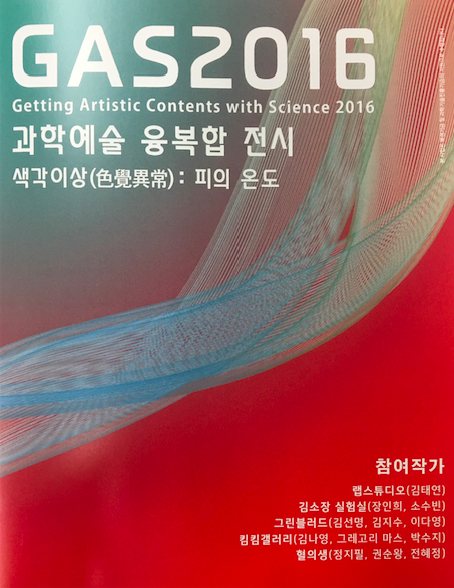[예/기:술 – 2 ] 식물-(인간)-동물 그리고 과학예술
이번 [예/기:술]에서는 세계 속에서 서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궁극적인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이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겠지만 근대적 인간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조물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근대’의 의미는 인간에게 주체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해체주의의 시각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간과 기술과 환경, 더 나아가 자연과 동식물이 기술과의 겹쳐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에 과학과 예술을 하나로 보던 시각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전시인 <<색각이상: 피의 온도>>에서는 ‘피’라는 주제로 과학 예술 융복합 전시를 열었다. 이 전시는 과학과 의학 분야의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협업을 하여 설치, 미디어, 회화,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 전시에 소개된 퍼포먼스는 한 남성에게 인체 실험을 하기 위해 약품을 주입하고 점차 후각, 미각, 청각, 시각을 잃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또한 이 퍼포먼스에 등장하는 식물을 통해 식물이 가진 굴성적 운동 감각기관과 인간의 감각기관 상실과의 연관성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또한 권순왕 판화가, 전혜정 기획자, 정지필 사진작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혈의생>작품에서는 “자연 및 타인과 공생하는 수평적, 확산적 세계관을 피를 통한 생명과 나눔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혈의생”이라는 작품 제목은 피를 통해 생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인간은 인간 중심의 수직적 세계관에서 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자아중심의 환원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중심, 자아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과 공생하는 수평적 세계관, 타인과 공존하는 확산적 인간관을 혈액의 이미지를 이용한 생명과 나눔의 모습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전혜정 “[혈의생] 피를 통한 생명과 나눔” 글에서 부분 발췌

“모기는 다른 동물의 피를 빤다.
동물이 먹고 소화시킨 영양분이 피를 통해 각 기관에 전달이 된다.
피는 모기에게 값진 영양원이다.
피를 빠는 모기는 모두 암컷이다.
모기는 일반적으로 초식을 하지만 알을 부화시키는 시기의 암컷 모기들은 피를 빤다.
피는 부화를 위한 값진 영양원이지만 피를 빠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피를 빨려고 동물에게 다가가다가, 피를 빨다가, 빨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다.
피는 값지지만 대가는 자신의 값진 목숨을 희생할 지 모른다.
더 값진 자기 아이들의 부화를 위해서.”
정지필 작가노트 中

나는 식물을 먹는 동물의 모습이 아닌 동물을 먹는 식물을 생각했다. 그동안 책에 나타난 생태계의 먹이사슬 도표를 보면 피라미드 형태의 도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종의 정점에 인간이 있으므로 해서 모든 생태계를 지배한다는 논리에 부합한다. 이를테면 풀을 동물들이 먹는다는 것, 이러한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인 관계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제시하는 것이 본 작업의 목표다. 자연은 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다는 관계성에 방점을 둔다. 모든 생물체는 거의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물질을 섭취하며 존재한다. 모기 또한 사람의 피를 먹고 살지 않는가. 본인이 제시한 피를 식물이 먹는다는 설정은 아름답지 않은 가설이다. 그러나 우리의 풍경은 얼마나 불가능한 풍경의 연속인가. 이러한 예는 과학문명의 발전과 함께한, 비도덕적인 상품에서도 발견되었다. …(중략)… 물과 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대체된 피를 밀과 보리 씨앗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어떨까? 이것은 식물의 서사에 인간이 개입하는 불편한 콜라주다.
권순왕 작가노트 中
위의 작품과 같은 일련의 시도는 모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간과 과학기술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역설에서 출발한다. 정연심 미술비평가의 글을 인용하자면 “과학과 예술을 고려할 때 보통 우리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특정 테크놀로지를 연상할 때가 많이 있다. 이러한 특정 기능과 기술 중심으로 재편성된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과학이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탑-다운(top-down) 방식의 기능과 기술적 효용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기 마련이다.”
특히 이러한 전시가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적 연구의 시도라고 본다면 그것은 과학기술을 예술에 접목하거나 또는 과학기술이 예술의 심미적 기능을 차용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번 [예/기:술]에서는 합일의 측면에서 다루었던 <1. 신을 통한 합일: 고대 그리스 예술>에 이어 두 번째로 “공생”을 위한 융복합적 발상을 과학기술과 예술의 예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는 예술과 기술의 측면에서 좀 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ditor 김 주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