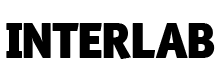재난 이후에 무엇이 가능할까?: 동북대지진 이후의 <모두의 집> (PART 1)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 일대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다. 바로 동북대지진이다. 그것이 1995년에 일어난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다른 점은 바로, 해일의 피해가 뒤따라 발생했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로 인해서, 해일 피해를 입지 않던 주민들 또한 피난을 가야만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북대지진은 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자력 문제에서 피난을 가는 사람 이 세 유형의 사람들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들은 ‘피난자’라는 말로 묶여서 생활을 하지만, 집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수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대상 ‘방사능’ 때문에 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각각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지진의 피해는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진의 두려움을 인식했던 것도, 어쩌면 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라는 복합적인 피해가 나타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동북 지방이 1차 산업 중심이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도 도쿄와 같은 큰 도시는 음식물 재료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동북 지방에 의존해 왔었다는 것이다(1). 그리고 동북 지방의 사람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일시적으로 피난을 오거나 아예 정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동북이라는 지방이, 고립된 하나의 장소가 아닌 도시 중심부와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는 지엽적이라기보다 더 전국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011년 3월 11일에 지진 후에 발생한 해일의 피해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에서) *출처: 아사히 신문
건축가의 고모토 히데오(河本英夫)는 메타볼리즘을 “다양한 현상의 발현에 대응하여 하나하나 구조를 가정하여 마련한다”고 하며 그것을 구조주의적인 것으로 보았다(2). 이 말은 메타볼리즘이 처한 한계이자 건축물 일반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아무리 변화에 적응되는 건축물을 세우려고 해도, 건축물의 최종적인 물질적 특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는 H.R. 마툴라나와 F.J. 바렐라(H.R. Maturana & F.J. Varela)의 오토포예시스(autopoiesis) 개념을 통해 도시 계획에 있어서 활동과 코드의 순서전환의 가능성을 본다. 이 개념은 자기생산을 나타내는 말이며, 마툴라나와 바렐라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는 매커니즘이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이 말은 매커니즘 안에 머무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연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 고모토는 그들의 이론을 가지고, 건축에서 건축가와 착공과 관련되는 사람 사이에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에 가능성을 오토포예시스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한다(3). 즉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목적을 삼으면서도 과정 속의 변수를 배제하지 않고 가능성이 열린 상태로 본다. 설계를 담당하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되어 밑의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는 방법과는 달리, 하부구조를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틀에 갇히지 않는 설계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커뮤니티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야마자키 료(山崎亮)는 건축가 또는 국가만 권력을 소유하고 설계하는 것과 다른, 주민들의 적극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4). 건축가보다 주민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부의 도움 역시나 필요하지만, 내부의 유동성을 함께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동북대지진 이후 도시를 유기체로 보고 도시 계획을 하는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이는 사실 1923년의 관동대지진의 경우만 해도, 주택을 마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오오츠키는 당대 설립된 ‘도준카이(同潤会)’의 주택 공급 방식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주택 외에 목욕탕, 가게, 직업훈련시설을 겸비하였다고 언급한다. 즉 단순히 건축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생활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근대적인 주거방식이 획일화되는 과정에서 효율성에 치중한 결과 건축물을 설계의 속도가 중요시되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결여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공급된 이 간이주택들은 일차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11 이후의 건축과 사회디자인』의 저자 미우라 아쯔시(三浦展)는 20세기에 일본에서 추진된 도시 개발을 ‘패스트 풍토’라 보고, 이것이 지역성과 경관마저 획일화했다고 본다(5). 한편 건축가 이토 토요오(伊東豊雄)는 근대 건축이 ‘회색지대’를 없앴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은 물론, 나와 타인 간의 관계마저 완전히 구분해 버렸다는 것이다(6). 이 이야기는 동북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마련된 간이주택의 경우에도 다시 적용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동북대지진이 그 이전에 1995년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어난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다른 점은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의 비중이 컸던 부분이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연과 함께 일하며 지역 간의 유대를 중요시해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주민들보다 동북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커뮤니티를 더 중요시해 왔다. 간이주택은 빠르게 마련할 수 있지만 지역 간의 유대를 재형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간이주택 말고 건축가가 이끌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2011년 4월3일, 리쿠젠타카타에 세워진 간이주택의 모습
일찍이 60년대를 중심적으로 활동한 건축운동 메타볼리즘에서 건축가들이 글과 건축물 실현을 통해 도시를 재창조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들 건축가는 도시를 외연적이든 내연적이든 간에 유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집보다 도시에 관심을 둔 이유는 구성단위를 공동체로 바라봤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한 건축물이 도시로서 어떤 영역을 차지했다면 동북대지진 이후 건축가들은 어떤 틈새에 대한 관심으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 유기적인 시각을,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보는 사례로서 건축가 이토 토요오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모두의 집> 프로젝트가 있다. (Part 2로 계속됩니다)
(1) 『3.11後の建築と社会デザイン』 p.141
(2) 河本英夫, 『オートポイエーシス 第三世代システム』 p.194 재인용
(3) 바렐라와 마툴라나의 이론은, 코모토에 따르면 이론적인 완성도 수준이 떨어져기에 다방면의 이론으로 확장돼서 활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4) 『3.11後の建築と社会デザイン』 p.144-146
(5) ‘패스트 풍토’라는 말은 ‘패스트 푸드’처럼 간단하고 신속히 소비되며, 도처에 존재하는 도시개발을 뜻하는 것 말인데, 일본어의 발음이 서로 동일하며(ファスト風土/ファスト・フード:화스토후도) 비꼬아 말한 것이다. 『3.11後の建築と社会デザイン』 p.130
(6)이토 토요/이정환 역, 『내일의 건축』, 안그라픽스, 2014, p.43
editor Konno Yu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