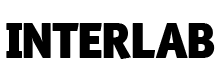벽처럼 납작하고 평평한 얼굴: 박진아 <사람들이 조명 아래 모여 있다>
1. 이름을 상실한 인간
무대에 어떤 사람이 서게 되면 관람자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본다. 연출에서 인공 조명을 비롯해 보조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받아, 그 사람은 무대 위에서 빛을 받아 비유적으로 빛나는 존재이다. 이때 관객석에 앉아 무대를 보면 거리가 꽤나 먼 것처럼 느껴진다. 물리적인 위치도 그렇지만, 관객석과 무대 위치에 따라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대조적이다. 조명을 환하게 받는 주인공과 그 사람을 보기만 하는 관객은 확실히 다른 존재이다. 계속 앉아 주인공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몰입하면서 서서히 보는 대상을 닮아간다. 주인공이 위기를 당하면 불안해하고 승리를 거두면 기뻐하며 주인공과 심리적 거리를 좁혀간다. 이와 같은 수용방식은 오늘날 보다 일반적으로 영화관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주인공이 수행하는 역할이며 그 인간상 자체는 아니다. 물론 멋진 배우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은 연기이며 연출의 결과이다. 이때 배우들은 주인공 혹은 다른 역할을 맡아서 보여주지 인간상 그 자체와 다르다. 앞서 보았듯 무대 위의 주체와 관람객의 거리를 좁히는 방식은 몰입에 의한 결과이다. 그것은 연출된 (종종 이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어떤 사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과 달리 무대 위에 서는 사람, 관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점이 있을까?
답은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그 사람들 역시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 관객과의 차이가 사라진다. 모두, 그러니까 배우도 스태프들, 그리고 관람자가 근본적으로 인간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세 범주는 다른 공통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그리고 위치 관계를 보아도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상실한다.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본인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보조역할은 천막 뒤에 서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보는 사람들은 관객 혹은 관중이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식별해주는 기회조차 없다. 이때 ‘나’라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모두 ‘나’라는 위치에서 물러서서 다른 사람 (심지어 존재조차 안 했던) 이름으로 연기를 하며 또는 아예 이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무대와 관객을 갈라놓는 개념과 물리적 공간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때 ‘개개인의 상실’이라는 표현 대신 ‘이름의 상실’이란 말이 더 적합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익명성뿐만 아니라 이름의 대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객과 보조들은 거기서 특정인물로 비추어지지 않는다. 그 개인적인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혹은 강조되지 않은 채 어둠과 인파 속에서 개개인은 특정지을 수 없다. 한편 주인공의 경우는 ‘나’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서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대체되어) 거기에 서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사람들은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이 된다.

<크루 02 (경복궁)>(2017) (일부)
2. 뭉개진 얼굴, 껍데기만 남은 인간
박진아의 회화 작업은 이름의 상실을 보여준다. 지난 주부터 합정지구에서 열린 개인전 <사람들이 조명 아래 모여있다>에서 작가는 공통적으로 콘서트장과 현장촬영에 인물과 조명을 모티프로 등장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역할마다 다르게 그려진다. 근본적으로 보면 촬영에 필요한 장치를 조종하는 사람과 주인공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할뿐더러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며, 역할에 따른 차이는 강조해야 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시각적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어 주인공은 크게 그려지고 관객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작품을 보면 사람들은 그 위치관계에 근거한 차이밖에 확인하지 못한다. 작품을 보면 주인공, 스태프, 그리고 관객들의 관계가 위치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알 수 있지만, 인물 모두 똑같은 얼굴이 표현된다. 작품에서 사람의 특징을 잡을 때 가장 적합한 얼굴을 추상화시켜 세부적인 묘사가 거부된다. 이때 뭉개진 얼굴에서 표정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차이를 알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주인공과 보조, 그리고 관객들을 단지 위치적으로만 정해놓는다. 조명 아래에 있거나 없는, 그리고 기계를 들어 도와주고 있거나 연기를 하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 얼굴의 특징을 잡아내기 힘들다. 뒤에 보이는 건물 외관, 그리고 너무 밝아서 그 물체의 공간감을 상실한 조명 못지않게 사람들의 얼굴은 평평하기만 하다. 이는 사람을 어떤 형태로, 지극히 납작한 형태로만 보는 행위이다. 이 표현 때문에 각 개인들마다의 차이뿐만 아니라, 역할에 따른 위계도 이때 사라진다. 누가 그 장면에서 주인공인지, 보조인지, 아니면 지나가다 마주본 관객인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그려졌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끝끝내 그 인물들을 표현 못지않게 같은 존재로 본다.
따라서 전시 제목에 드러나는 ‘조명’은 굳이 문자 그대로 조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조명 아래’에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빛 아래에서 얼굴이 뭉개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이, 작가 박진아의 표현에서 사람의 얼굴은 세부적인 묘사를 거부한다. 빛에 의해 공간감과 물리적 깊이가 상실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개별적 특징, 역할에 따른 위치감각 또한 상실된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 즉 특정 인물로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표기가 복수 형태로 가능해진다. 배우와 스태프들, 그리고 관객으로 세분화시킬 수 없어 그들은 사람들로밖에 묘사할 수 없다. 이는 어쩌면 작가에게 있어 인간을 표현하는 일은 역할을 불문하고 ‘인간 그 자체’로 다루는 것과 같다. 주인공과 보조, 그리고 관객은 나중에 주어진 역할분담이다. 이러한 역할, 그리고 위치 관계는 모두 회화작업에서 거의 무효화되어 인간 그 자체로 표현된다. 인간은 보편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각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박진아 작가 작업에서 사람의 얼굴은 개성도 개별적인 특징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을 보편성과 개성의 결합체로 보았을 때, 작가가 후자를 배제하여 표현한 사실에서 ‘인간 그 자체’라 표현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작품에 나타난 인물 중에 누가 주인공이고 관객이며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크루 02 (경복궁)>(2017)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과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은 모두 구별하기 쉽지 않아 모두 똑같이 인간 그 자체로 그려진다. 무대 세팅이 그렇듯이 얇게 놓인 배경, 표현적으로 그것을 닮은 인간이 보인다. 껍데기만 남은 인간을 작가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시각적인 껍데기로 그렸다.
사람들은 조명 아래 자신의 이름을 상실한다. 무대 주인공, 충실한 보조,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상실하고 익명성과 주인공 이름에 존재를 내어준다. 그리고 사람을 판별해주는 가장 특징적인 얼굴마저 빛에 의해 가려진다.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서거나, 묵묵히 기계를 들어주는 스태프, 그리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 전시 제목 ‘사람들’은 바로 극장에 있는 모두에 대표된 인간일반을 가리키지 않을까. 조명에 의해 지워지고 얇게만 드러난 형상, 그것은 인간형태로만 보이는 몰개성적인 인간 그 자체이다. 평평한 얼굴은 어스름한 빛, 그리고 뒤에 보이는 건물 외관과 가이 깊이도 없고 특징도 찾아내기 힘들다. 어쩌면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보이는 묘사는, 사실상 그들마저도 무관심한 채 사는, 이름을 상실한 모습이다.
editor Konno Yu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