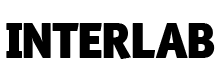칼럼 – 하얀 공포 Part 2 : 하태범 <s-> 시리즈
이번 전시 《대립의 공존》(아트 스페이스 와트)에 포함된 작업 <s->연작을 보면 하얀 배경 가운데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공통적으로 흰 종이 위에 보도사진에 찍힌 인물을 오려낸 것처럼 보이는데, 유심히 보면 하얀색을 칠한 흔적이 조명 아래 드리워진다. 이 작품은 출력한 사진 위에 칠을 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작품이지만 회화인가 사진인가? 그 질문을 시작으로 이 작품에서 보이는(/보이지 않는) 대립과 공존을 세 가지로 분석해본다.
![20171208_155503[1]](https://interlab.kr.object.iwinv.kr/wp-content/uploads/2017/12/27205151/20171208_1555031-e1513654014129-742x500.jpg)
제1의 대립과 공존: 작품 – 동(動)과 정(靜)
이 작품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사진 작업 위에 하얀 색으로 칠한 것이므로 원래 매체에 따라서 사진작업이라 불릴 것이다. 전자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면 후자는 환영을 창출하는 것이다. 비록 오늘날 인터페이스의 등장으로 이 경계자체가 거의 무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작업은 사진 매체이며 아크릴 물감으로 칠한 회화 매체를 쓴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작업의 흥미로운 부분은 사진 속 인물을 남길 때 윤곽이 흐려지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온전하게 오려낸 사진과 달리, 인물의 윤곽선이 슬쩍 블러(blur) 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페인팅의 인상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는 어떻게 보면 사진이 애초부터 갖는 딜레마, 즉 움직임을 정지 상태로 포착하려면 온전히 움직이는 상태로 프레임에 포착할 수 없는 사진의 특성이기도 하다. 즉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사진으로 찍힐 때도 움직이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블러 효과처럼 처리된 윤곽선은, 이 작업에서 페인팅의 붓질로 표현되어 마치 어떤 동(動)영상을 캡처한 것처럼 흐려진다.
제2의 대립과 공존: 칠하기 – 더하기와 빼기
일반적으로 칠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보탬 혹은 추가의 의미로 나타난다. 물감이 더 필요하고 색깔이 더해지거나 행위가 수반될 때 칠한다는 말이 갖는 의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캔버스를 영의 상태로 본다면 그 위에 붓질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진 작업에서 배경이 하얀 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사라진다. 애초에 보이던 건축물이나 자연환경이 작가의 손으로 온갖 하얀 색으로 뒤덮이게 된다. 그럼으로써 관람자는 애초에 보이던 장면을 확실치 않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전시 제목을 따라 분석하면 칠하는 행위에 더하기와 소멸 간의 대립이 공존한다. 제작과 파괴가 한 데 어우러진 작업이 2016년 리안 갤러리 《WHITE》전에 소개가 되었다면, 이번에 소개가 된 <s->부터 시작하는 연작은 칠하는 행위 자체에 더하기와 빼기의 대립을 공존시킨다.
제3의 대립과 공존: 무중력 – 고립과 자유로움
배경에서 고립된 인물은 우선 물리적으로 떠도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하얀 배경 위에 그려진 것도 아니지만 마치 그 배경 위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공간적으로 보면 살짝 땅바닥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다. 하얀 바탕 안에 (말 그대로) 부유하는데, 여기서 인물은 배경이 사라지면서 줄거리에서 빠져 나와 있다. 프레임 내부에서 공간적인 부유상태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부유상태 또한 드러내준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모습은 서사적인 맥락과 주변환경에 긴밀하게 연관된다. 사진의 경우 주변에 어떤 것이 찍혔느냐에 따라서 화면 안에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작업은 배경이 지워지면서 사진에 찍힌 인물이 현실의 무대에서 떨어져 나와 맥락 없이 떠돌아다닌다. 필립-로르카 디코르시아(Philip-Lorca diCorcia)의 <HEADS>(1999-2001) 연작에서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위에서 자동으로 터지는 조명 아래 찍히면서 이름없는 ‘주인공’이 되는 것과 달리, 하태범의 사진에서 하얀 색은 인물을 (계속) ‘고립된 상태’로 남겨둔다. 그것은 자유로움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상황을 동시에 보여준다.
editor Konno Yu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