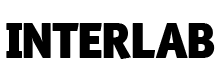폐허는 공허하지만 빈터가 아니다 : 《촉각적 원근법》 리뷰
폐허가 있다. 그 낡은 건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생명, 다른 말로 기능을 다한 것으로 그 건축물의 ‘존재’를 본다. 여기서 존재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건물, 그렇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 폐허이다. 사람은 이제 거기서 생활하지도 그 공간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공허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빈터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얻은 인상과 다르다. 사람들이 폐허를 찾아가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이전의 건축물의 모습, 그와 관련된 역사, 아니면 ‘어쩌다’ 마주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추억? 이 질문은 “왜 그 사람이 폐허를 찾아갔는가?”와 다르다. 여기서는 자신의 기억을 찾거나 유령을 보겠다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는 목적이 있다. 이때, 파트릭 모디아노(Patrick Modiano)의 소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Rue des Boutiques Obscures)』처럼, 나도 모르게 잘못 새겨진 기억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도 있지만 말이다.
 강우영, <White Out>, (2017)
강우영, <White Out>, (2017)  지승열, <촉각과 내뿜음>, (2017)
지승열, <촉각과 내뿜음>, (2017)
예술작품을 보러 간다는 목적은 앞서 본 두 질문에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작품을 감상할 때 건축물의 역사를 확인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때 사람은 폐허에서 모호한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맞이한다. 《촉각적 원근법》은 구의취수장의 관사공간을 전시장으로 삼았다. 이제 제 기능을 다하고 폐허가 된 3층짜리 건축물의 거실공간이 전시공간이 되어 총 1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각 실내공간에 여러 작업이 소개가 되었다. 작품의 형태는 드로잉(탁본), 설치(Installation/Sound Installation), 영상, 가상현실체험 등 다양한데, 공통적인 특징은 작품의 주제가 그 장소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작품과 장소의 물리적인 관계이다. 강우영의 <White Out>은 벽지 디자인을 하듯이 실내 공간에 나프탈렌 가루로 붙여놓은 작업이다. 좌대와 함께 옮겨 다닐 수 있는 작업과 달리, 떼어낼 수도 없고 전시장 내부에서 그 위치를 변경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지승열의 <촉각과 내뿜음>은 VR장비를 쓰고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몸의 움직임에 맞추어 민들레 씨앗이나 큐브 형태가 움직이거나 변화한다. 비록 그의 작업이 가상현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곳 실내의 공간을 염두에 두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장소와 긴밀하다.
또 다른 해석은 작품에 그 장소와 관련된 사회역사적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권혜원의 <염소의 맛>은 상수도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사라진 강과 사람의 관계를 영상과 설치로 보여준다. 그리고 김준의 <플리센>은 버려진 물탱크에 사운드 설치를 한 작업이다. 그는 심장박동 소리를 사운드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객들에게 생명감을 인지하게 만든다. 이들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장소의 사회역사적 맥락이다. 취수장을 둘러싼 이야기 거리를 작가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해석은 각각 분리된 것은 아니며 작품에 상호’보완’이 아닌, ‘상호’강화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시를 통해서 장소의 물리적이고 사회역사적인 관계는 작품에서 최대효과로 나타난다. 장소의 맥락과 상관없는 작업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장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보다 작품의 주제를 더욱이 밀도 있게 드러내준다.
 권혜원, <염소의 맛>, (2017)
권혜원, <염소의 맛>, (2017)  김준, <플리센>, (2017)
김준, <플리센>, (2017)
 해미 클레멘세비츠, <D.E.A.F>, (2017)
해미 클레멘세비츠, <D.E.A.F>, (2017) 진나래, <나투라 나투란스>, (2017)
진나래, <나투라 나투란스>, (2017)
여기서 몇 가지 작품은 언뜻 보면 폐허의 모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의 <D.E.A.F>이나 진나래의 <나투라 나투란스>에서 실제로 설치작업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쓰인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폐허 속으로 들어간, 아니 폐허로 동화되었다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전시에서 작품은 최종목적지로 나아가는 폐허의 ‘운명’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다. 여기서 최종목적지란 폐허의 소멸인데, 그것은 희망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어지는 운명이다. 폐허가 소멸하였을 때, 그것은 새로운 건축물로 등장하거나 아예 구조조차 사라진 황량한 빈터가 된다. 다행히(?) 전시장으로 쓰인 건축물은 2018년에 새로운 레지던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품은—긍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소멸로 향해가는 건축물에 일종의 유보상태를 부여한다. 시간의 정지상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작품들이다. 그 상태, 다시 말하자면 폐허의 상태를 폐기물과 그곳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주목하면서 그 공간을 폐허로서 보여주고 있다.
editor Yuki Ko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