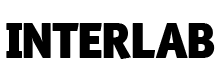확장과 번역 : 토마스 사라세노 《행성 그 사이의 우리》
인간이 만약 우주공간에 던져졌다면 우리는 그 공간의 헤아릴 수 없는 크기, 너비, 그리고 규모에 압도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역으로 이때 인간의 존재가 작고 여린 존재로 인식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번에 열린 예술가 토마스 사라세노(Tomás Saraceno)의 《행성 그 사이의 우리》 전시는 그 공간의 크기에 말 그대로 압도되는 작업이 소개되었다.
관람객은 전시공간으로 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때 에스컬레이터는 지상과 다른 곳, 말하자면 현실과 현실 아닌 곳을 연결해 주는 매체에 적합하다. 분명한 경계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은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에 몸을 맡기어 두 공간 간의 이동을 흐르듯 인식하게 된다. 에스컬레이터는 사라세노가 보여주는 우주공간으로 인간을 초대하는 데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공간은 하얀 구 모양의 오브제가 전시공간 높이 떠 있으며, 그 공간 전체에 퍼지는 암흑과 대조를 이룬다. 대규모 설치가 된 그 공간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공간자체에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 바닥은 바닥이며 스크린은 스크린이며 그 너머 뚫고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공간은 마치 거리를 잴 수 없을 만큼 퍼진 우주공간과, 무중력 상태에 붕 떠 있는 별들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실제적으로 광범위한 설치에 이어서 관람객이 보게 되는 것은 미세한 존재, 바로 투명한 큐브 안에 있는 거미이다. 거미집에 있는 거미는 가까이 다가가도 잘 보이지 않으며 한눈에 살아있는 것인지 알기 힘들 정도이다. 거미줄은 확대되어 스크린에 별자리처럼 비추어진다. 그런데 이 공간에 거미보다 미세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먼지, 우주 먼지이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것을 스크린에 확대해서 비추어지는 이미지와 동일한 것으로 가늠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스크린을 통해 비춰지는 영상에 의해 그 근간을 모호하게 한다. 확대되어 투영된 거미와 거미줄, 그리고 그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먼지(cosmic dust)의 모습이 검은 스크린 위에 나타난다. 미세한 것들을 확대하여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우주공간처럼 느껴지는 작업은 다른 작가 작업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의 <De-extinction>(2014) 이나 멜빈 모티(Melvin Moti)의 <Eigenlicht>(2012)이 그렇다. 전자는 호박(琥珀)과 그 안에 보이는 곤충들, 그리고 후자는 광물을 포착하여 확대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미세’에서 ‘극대’로 넘어간다.
그런데 사라세노의 이번 작업은 단지 시각적인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다. 전시 공간에 들리는 사운드는 이 우주 먼지를 인식한 다음 변환되어 생성된 것이며, 전시공간에 퍼지면서 관람객과 거미집으로 전달된다. 말하자면 실제 물질적 차원은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번역과정(translation)’을 통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라세노의 작업은 단지 미세와 극대를 시각적 유사성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세와 극대의, 그리고 여러 감각 간의 ‘번역을 통한 왕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토마스 사라세노 《행성 그 사이의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7) 전시 리플렛
editor Yuki Ko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