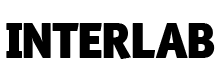아라카와 에이 《Tryst》
대문사진 : Ei Arakawa, “Tryst”, installation view at Taka Ishii Gallery Tokyo, Feb 10 – Mar 11, 2017, photo: Kenji Takahashi
무대예술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그 전통이 옛날부터 계승되는 곳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이다. 여기서 무대예술은 크게 연극과 오페라, 그리고 발레의 이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것들에 하나 더 붙일 수 있다면 바로 뮤지컬이다. 뮤지컬의 탄생과 발전은 무대예술의 전통이 깊지 않던 영국이나 미국에서 전개되었다. 물론 20세기를 거쳐오면서, 두 나라에서 뮤지컬만이 공연의 자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이나 존 쿠리지 애덤스(John Coolidge Adams)의 오페라나, 엘리자베스 스트렙(Elizabeth Streb) 작품에 나오는 곡예사와도 같은 무용수,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의 무대예술은 20세기 무대예술의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져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참신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뮤지컬의 존재가 컸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나의 종합예술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며, 상업적인 성공,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를 끈 이 무대예술은, 영국과 미국, 이 두 나라의 존재 없이 생각할 수 없다.
아라카와 에이(荒川医)는 1998년부터 뉴욕을 기점으로 활동하는데, 그의 작품은 설치(installation)과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로 주축을 이룬다. 2017년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도쿄에 있는 타카 이시이 갤러리(Taka Ishii Gallery)에서 열린 전시 《Tryst》에서, 작가는 20세기 중반에 일본에서 전개된 구타이미술협회(具体美術協会)의 동향을 뮤지컬로 표현하였다. 런던 이스트엔드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발전된 뮤지컬은, 아라카와의 작업에서 그 무대를 일본의 서부, 간사이(関西)지방으로 설정되어, 스피커에서 들리는 캐치한 음악과 영어의 대사, 그리고 간사이 지방의 방언으로 된 자막과 함께, LED로 된 설치가 전시공간을 찾는 관객을 맞이한다. LED로 된 다섯 개의 설치물은 각각 구타이 그룹에서 활동한 예술가 (요시하라 지로, 카나야마 아키라, 시마모토 쇼조, 타나카 아츠코, 시라가 카즈오)의 작품을 참조하여 만든 것들이다. 전시공간에 퍼지는 음악과 함께 빛이 점멸하는 설치물의 ‘무대’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거기에는 배우나 댄서가 있는 것도 아니며, 관객이 설치된 LED으로 보다 자유로이 다가가 그 ‘무대’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미술사 혹은 연극의 역사를 들여다보았을 때, 작품과 관객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무대예술이 여러 예술 장르와의 상호작용으로 탄생되었다면, 20세기에 진행된 많은 퍼포먼스 예술 또한 마찬가지다. 앨런 캐프로(Allan Kaprow)의 해프닝이나 플럭서스(Fluxus)의 일련의 시도, 그리고 애초에 구타이미술협회가 시도해 온 것들. 이들은 회화나 조각이 작품 그 자체로 평가 받아온 것과 달리, ‘행위’를 다루었다. 행위는 회화나 조각에서 과정으로 간주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예술가들에 의해 작품과 함께 예술가의 현전으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다시 살펴보았을 때, 아라카와가 작품에 시도해 본 접근은 미술사의 계보를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라카와의 작품은 작가로서의 현전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작품으로 나타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가 등장하지 않고 보관과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전시되었다.
아라카와는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연극적인(theatrical) 요소를 염두에 둔다. 작품과 관객 사이에 놓인 거리는, 한편으로는 예술작품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점 즉 몰입을 거부하는 작품성으로 나타나며 관람객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것은 일찍이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d Brecht)가 주장한 ‘Verfremdungseffekt(소외효과)’이다. 즉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관객의 동일화를 거부하고, 객관적으로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한다는, 하나의 교조적 태도를 지닌다. 이 부분은 이번 아라카와의 작품에 사용되는 대본에도 찾아볼 수 있다. 도입 부분에 작품(설치) 설명으로 나오는 대사는, 브레히트와 작곡가 쿠르트 바일(Kurt Weill)의 <서 푼짜리 오페라>를 상기시킨다. (음악으로) 공연되는 ‘GUTAI UNDER FEET’의 줄거리는 전기적 사실과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화려하고 환상적인 무대도 아닌데다가 주인공의 감상적인 연기(演技)도 존재하지 않은 채, 주제인 구타이미술협회를 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관람자에게 제공한다. 진행되는 이야기를 허구로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걸듯이 이 작품은 관람객에게 보여진다.
뮤지컬의 내용은 전술한 구타이미술협회의 발전과 그룹의 해산(리더 역할을 했던 요시하라의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구타이미술협회와 그 상업적 성공과의 관계이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구타이미술협회는 아라카와의 작업에서 상업적인 예술 장르인 뮤지컬로 표현되며, 미술작품이 놓인 ‘오늘날의 살롱’—대규모로 진행되는 아트 페어의 상업성과 관련 지어진다. 구타이미술협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작가의 작품을 토대로 만든 다섯 개의 설치물과 뮤지컬, 그리고 전시공간 바닥에는 ‘Art|Basel’ 문구가 들어간 녹색 매트가 깔려있다. 구타이미술협회와 뮤지컬, 그리고 거울글씨로 나타난 ‘Art|Basel’ 문구는 어떻게 보면 풍자적으로 보이는데, ‘발 밑에’ 놓인 매트는 뮤지컬 제목인 ‘GUTAI UNDER FEET’와 아트 바젤과의 관련성을 넌지시 말해주는 듯하다. 2017년에 열리는 아트 바젤의 언리미티드(unlimited)에서 실제로 출품하게 될 이 설치작업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editor Yuki Ko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