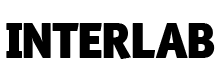엘리자베스 페이튼 《Still life 靜/生》 전시리뷰
정물靜物을 뜻하는 영단어 ‘Still life’는 미술사 속에서 별달리 낯선 말은 아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 쟝-밥티스트 시메옹 샤르댕(Jean-Baptiste Siméon Chardin)의 그림, 폴 세잔(Paul Cézanne)이 그린 사과 등등 정물화는 미술 작품의 흔한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물이라는 주제는 샘 테일러-우드(Sam Taylor-Wood)의 <Still Life>(2001)처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작업으로 제작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회화의 범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엘리자베스 페이튼(Elizabeth Peyton)의 작품이 그렇다.
도쿄, 하라미술관(Hara Museum)에서 미국 여성화가 엘리자베스 페이튼의 전시《Still life 靜/生》가 열렸다. 2017년 1월 21일부터 열린 이번 전시는 일본에서 갖는 첫 개인전의 자리이다. 정원을 지나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면 페이튼의 작품과 함께 상설전시작업으로 마련된 공간에서 쟝-피에르 레이노(Jean-Pierre Raynaud)의 <0의 공간>(1981)이나 미야지마 타츠오(宮島達夫)의 <시간의 연쇄>(1989-1994)를 관람할 수 있다.
《Still life 靜/生》, 처음에는 그녀의 정물화 작업이 몇 개 생각나서 이번 전시회 제목에 별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전시장으로 들어가보면 정물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화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녀가 관심을 갖는 오페라 가수 요나스 카우프만(Jonas Kaufmann)을 비롯하여 (<Carmen; Jonas Kaufmann(3)>(2011) 역사적인 인물인 루드비히 2세(<Ludwig II Riding to Paris>(1993), 선대 여류 화가인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after Stieglitz, 1918>(2006), 심지어 강아지의 모습(<felix>(2011)까지 붓놀림이 뚜렷이 보이는 나무 판 위에 그려져 있다. 출품된 총 42점 중에 정물화보다 인물화의 수가 더 많은데 하필이면 왜 《Still life 靜/生》라고 전시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주제의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그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리플렛에 실린 작가의 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화는, 한 순간 순간의 시간의 축적이다. 혹은 시간을 들여 생겨나오는 것이다. 회화란, 그 자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건져내는 작업이다. 그림 속에 일어난 일을 단지 가만히 관찰한다. 회화는 시간과 함께 있으며, 그러므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 된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靜)’이라 할 때 작가가 가리키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붓 자국이 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결과물 즉 ‘퇴적된 순간’이다. 작품으로 전시된 것들은 순간을 멈춘 정적인 존재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혹은 그녀가 어떤 소재를 택하고 그릴지 고민한 과정이다. 심지어 대담한 윤곽선으로 스스럼없이 그려진 화면을 보면 ‘한 순간’이 축적된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것들은 작가의 행위에서 더 나아가 삶과 직결되는 ‘생동(生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하나에 설명문 없이 작품이 전시된 공간은 그녀가 무엇을 참조하고 그렸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만큼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녀의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가게 해준다.
<사진자료> Bitecho [http://bitecho.me/2016/12/05_1346.html]
<참고자료>
《Still life 靜/生》 전시 리플렛
editor Yuki Ko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