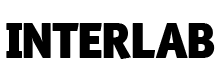칼럼 – 하얀 공포 : 하태범 《WHITE》
주세 사라마구(José Saramago)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미지의 병에 걸려 시력을 잃어간다. 처음 감염된 사람은 이런 묘사를 한다. “아무것도 안 보여, 마치 안개에 덮인 것처럼, 아니면 우윳빛 바다에 빠진 것처럼”. 시력을 잃은 사람은 하얀 세계에서 혼돈 속에 빠진다. 폭력과 욕망이 난무하는 세계. 그런데 이는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일까?
올해 2016년 가을(9.8~10.22), 서울 리안갤러리에서 작가 하태범의 전시 《WHITE》가 진행되었다. 전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작업에서 하얀 색은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2008년부터 작가가 계속해온 <화이트>시리즈를 선보인 이번 전시에는 시리아,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미니어처로 도시의 폐허를 만들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는 작업에서 폐허나 사건 현장의 이미지는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퍼진 잔해, 휘어진 철근, 그리고 사물의 표현은, 단번에 미니어처라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찍힌 미니어처를 보면 그것은 완전히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사건이나 재해가 일어났던 장면을 기록한 보도사진과는 달리, 흰색으로 처리된 도시는 현장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잔인함의 흔적은 흰색으로 통합되어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상자의 모습도 등장하지 않는다. 작품 속에 나타난 사건의 맥락을 알아도 우리의 감정은 사건에 대한 애도와 직결되지 않는다. 폭력적으로도 비극적으로도 보이지 않은 장면은 감상자의 마음까지 억누른다. 이러한 억제와 관련해서 그리스 미술의 <라오콘>을 분석한 빙켈만(Johann Joachim Winkelmann)의 주장을 떠올릴 수 있다. 그만큼 하태범의 작품에 드러나는 억제된 장면은 어쩌면 위대하고 초연한 것으로도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붕괴된 건축물 자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초연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 작품을 볼 때 우리가 갖는 무감정성은 보도사진을 볼 때와 어떻게 다른지, 관람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
TV를 볼 때, 더 이상 사건 현장은 뻔한 것이 되고 말았다. 영화를 보듯이 테로 장면은 ‘극적’이며, 채널을 돌려 나온 습격의 장면은 영화의 광고처럼 느껴진다. 하태범의 영상작업 <The Incident>(2016)를 보면, 제작한 소형 건축물이 공격받는 장면이 나온다. 하얀 색으로 된 연출적인 세팅과 사운드, 연출적인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상자는 무감각적으로 볼 수 있다. 순식간에 벌집이 된 소형 건축물은 작품 바깥 세계에 보다 많이 존재한다. 오늘날 시각에 바탕을 둔 수용방식에서 현실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가 현실인지는 모른다. 과연 우리는 뉴스나 방송망을 타고 오는 현실을 본다고 해서 현실로 완전히 다가갈 수 있을까? 오늘날 현실이라 불리는 것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것을 받아들인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가림막을 보고 있다는 것은, 벌써 맹인이 된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 하태범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것은 일상적인 무감정의 수용방식이다. 감상할 때, 그것이 하얀 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얗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진출처> Korea Artists Prize [http://koreaartistprize.org/en/project/ha-tae-bum/] (하태범 <Norway Terror>, 2011)
<참고 자료>
리안갤러리 전시 소개 (최진희), 2016
꼭 읽어야 할 미술비평, 도널드 프레지오시/정연심 외 역, 미진사, 2013
editor Yuki Ko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