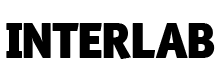칼럼 – 우드 앤 해리슨 : 놀이와 진지함의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놀이를 찾은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한 번 던지고, 책상 위에 세우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십 번 시도를 한 끝에 동영상을 올릴 만큼,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성공시킨 사람을 보면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다른 사람 또한 기뻐하고 있다.
영국에서 협동작업을 하는 예술가, 우드 앤 해리슨(John Wood & Paul Harrison)은 일상적인 물건 —오피스용 의자, 공, 물통, 종이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다. 색을 입힌 공을 떨어뜨리며 하얀 바닥에 파란 자국이 남기는 행위, 떨어지는 물통을 피하며 서 있던 자리를 옮기는 행위, 시소처럼 생긴 나무판 위에서 균형을 잡는 행위. 길이가 얼마 되지 않은 영상으로 구성된 <10 Things>(2001)을 보면, 이러한 단순한 행위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처럼 그들의 작업에서 영어의 things가 가리키는 ‘어떤 일’과 ‘어떤 것’이 소재로 등장하는데, 때로는 작가본인들이 나오고 단순하게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영상에서 1분도 되지 않은 행위는 즉흥적으로 보이며 결과가 행위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난다.
일상적인 물건을 가지고 미술작품을 제작한 작가 중에 스위스의 피슐리 앤 바이스(Fischli & Weiss)가 있다. 이들은 작업실에서 볼 수 있는 물감이 튄 물통이나 붓을 다시 작품으로 만들거나, 사진 연작 <조용한 오후>(1984-1985)에서 일상적인 물건을 조합하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들의 대표작으로 종종 말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방식>(1985-1987)에서 일상용품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피슐리 앤 바이스의 작업에서, 우드 앤 해리슨 작업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일상적인 물건이나 행위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우드 앤 해리슨의 작업은 행위에 대한 즉흥적인 간결함이 작품 이면에 존재하는 노고를 숨기고 있다. 피슐리와 바이스의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서 배경 자체가 일상적이었던 반면, 우드 앤 해리슨의 작업에서 배경은 세팅된 장면으로 나타난다. 단순한 색으로 칠해진 벽이나 책상, 그리고 작가의 옷차림은, 그 작업을 위해 준비된 상황이다. 작가들은 세팅된 공간에서 일상적인 물건을 가지고 극적인 행위를 연출한다. 그들의 작업에서 행위의 결과는 각본에 따라 몇 번 거듭하여 맺은 것이다. 우드 앤 해리슨의 작품의 특징으로 이러한 계산적인 측면과 즉흥적인 행위의 결과가 같이 존재한다. 그들은 행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행위에 진지할 뿐이다. <10 Things>중의 한 작품 <Van>(2001)에서, 달리는 트럭 안에서 의자에 계속 앉는 장면이 있다. 콘테이너 안에서 벽에 머리를 박고 의자와 함께 서로가 세게 겹치기도 한다. 그런데 작품에서 그들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그 행위에만 진지하다. 놀이의 측면과 진지함이 엇갈리는 그들의 모습은, 행위로 그려진 3차원적 드로잉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진 출처> Picture This [http://www.picture-this.org.uk/worksprojects/works/by-date/2001/twenty-six-drawing-and-falling-things]
<참고자료>
샬럿 코튼, 권영진 역, 『현대예술로서의 사진』, 시공아트, 2007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문혜진 역, 테마 현대미술노트, 두성북스, 2011
《プライベート・ユートピア ここだけの場所》, 2014 전시도록 및 작가 인터뷰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tc-Oi0BFRG4
editor Yuki Konno